“세계는 하나다.”
몇 년 전만 해도 이 말은 경제의 기본 원칙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는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디글로벌라이제이션(탈세계화)’,
즉 국가들이 다시 ‘자국 중심’ 전략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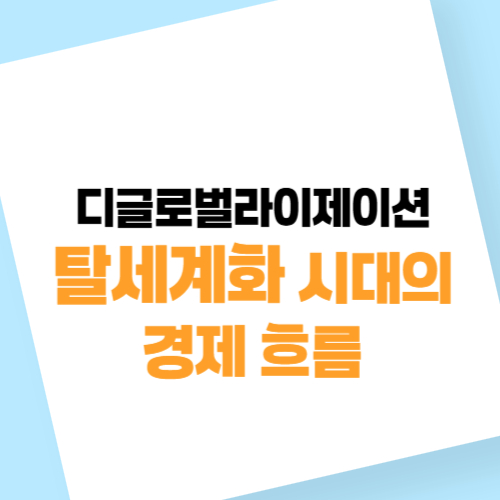
세계화의 균열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1. 팬데믹과 전쟁이 흔든 신뢰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치면서 국경이 닫히고,
해외에 의존했던 공급망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 마스크 하나 구하기 힘들었고,
-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없어 생산이 중단됐으며,
- 식량과 의약품이 부족해졌습니다.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에너지와 곡물까지 흔들어 놓았죠.
많은 나라들이 깨달았습니다.
“모든 걸 외국에 맡기면 안 되겠구나.”
각국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1.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
미국은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미국 내에서 전기차·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에 보조금과 세금 혜택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에는 다시 공장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유럽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유럽판 보조금 법안’을 통해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섰고,
일본, 인도 등도 비슷한 방식으로 국내 제조업을 되살리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 우방국끼리만 거래하는 공급망
미국은 “모두와 거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는 믿을 수 있는 나라(우방국)끼리만 기술과 물자를 주고받겠다는 전략을 쓰고 있죠.
이를 ‘프렌드쇼어링’이라고 부릅니다.


기업들은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
| 변화 | 설명 |
|---|---|
| 리쇼어링 | 해외에 있던 공장을 다시 본국으로 옮기는 것 |
| 프렌드쇼어링 | 믿을 수 있는 나라끼리만 협력하는 공급망 구축 |
| 기술 분리 | 미국과 중국이 서로 다른 기술 생태계를 만드는 현상 (예: 반도체, AI, 클라우드) |
| 보호무역 확대 |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규제를 강화 |
보호무역, 정말 좋은 걸까?
보호무역은 분명 단기적으로는 자국 산업과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은 숨을 돌릴 수 있고, 국내 공장이 돌아가면 고용도 늘어나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생깁니다.
- 외국 제품보다 비싸고 경쟁력 낮은 제품이 시장에 남을 수 있고,
- 결국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 또, 다른 나라가 보복 조치를 하게 되면 국제 무역도 위축됩니다.
그래서 보호무역은 ‘적절한 시기, 전략적인 사용’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 흐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 투자자라면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처럼 공급망 재편의 중심에 있는 산업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 직장인이라면
국가가 집중적으로 키우는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장기적인 커리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기업이라면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지역에 공급망을 나누는 리스크 분산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은 단순히 “국경을 닫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우리의 것’을 지키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앞으로 경제는 더 복잡해질 겁니다.
협력과 경쟁이 동시에 벌어지고, 기술과 자원의 흐름이 바뀌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글이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